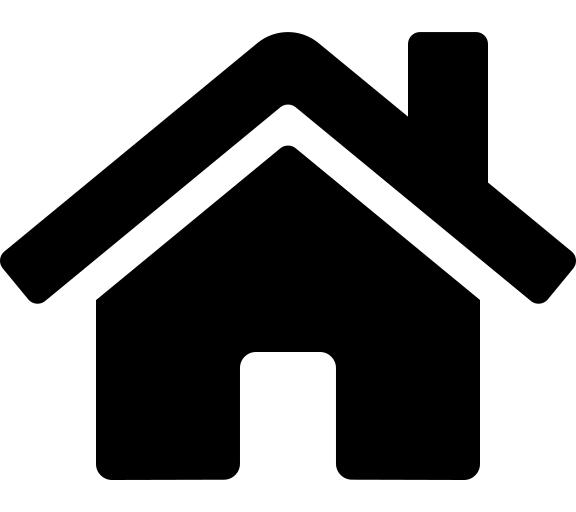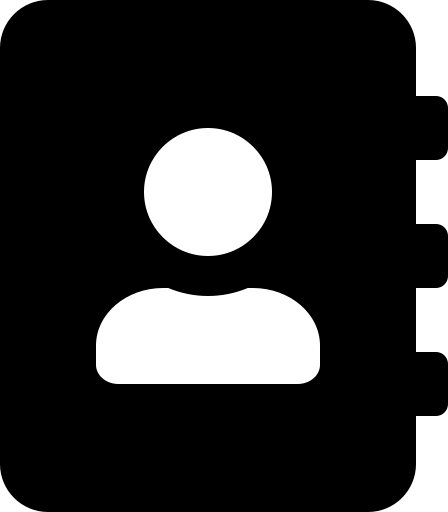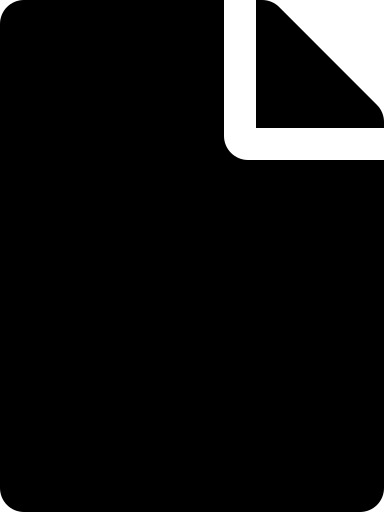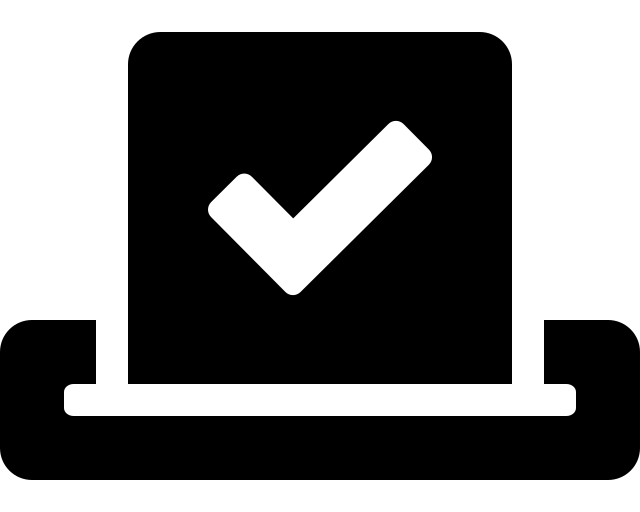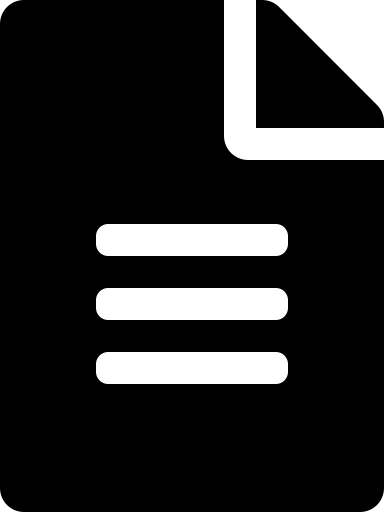성소수자위원회 논평]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우리"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을 맞이하며
매번 대선이 다가올 때면 떠올리게 되는 글이 있다. 바로 페미니스트 활동가 조이 레너드가 1992년 미국 대선 기간, 아일린 마일스의 선거 출마를 지지하는 의미에서 작성한 <나는 대통령을 원한다>이다. 서두가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로 시작하는 이 지지문은 4월 26일, 오늘이 레즈비언 가시화의 날인 까닭에 유독 더 사무치는 듯하다.
레너드는 말한다. “나는 레즈비언 대통령을 원한다. 에이즈에 걸린 대통령과 동성애자 부통령을 원한다. … 열여섯 살에 낙태를 경험했던 … 두 명 중 덜 악랄한 자가 아닌 다른 대통령 후보를 원한다.” 그것은 혐오와 차별 아래서 살고 투쟁한 피억압자 당사자가 무대에 섰을 때만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있는 까닭이다. 노동당이 노동자·민중이 주인 되는 정치를 수립하고자 하는 이유이고, 윤석열 퇴진 이후 이어질 선거에서 광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여성과 성소수자를 위하는 정부에는 여성과 성소수자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여성이 가부장제와 이를 기반으로 삼는 자본주의에 대항하고, 종국에는 여성해방으로 나아가야 한다. 더 많은 성소수자가 가시화되어야 하고, 발언권을 얻어야 하며,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정책의 유관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실패한 현재 한국 사회 및 정계와, 이에 유착하는 교계의 인식 속 성소수자와 실제 성소수자의 삶은 심각하게 유리되어 있다.
가령 올해 1월 13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는 작년 10월 11일 성소수자 단체들과 11쌍의 동성부부가 제기한 혼인평등소송 중 2건의 소송에 대하여 별도의 심사 없이 각하 및 기각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지난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일이다. 이처럼 동성 간의 관계를 대하는 현행법에는 논리와 타당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관성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현 정황 속에서 여성 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레즈비언 및 여타 여성 스펙트럼의 성소수자가 놓이게 되는 상황은 더욱더 취약하다. 비남성에 대한 차별과 다양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단단하게 교차하는 탓이다. 예컨대 레즈비언 부부들은 법과 사회의 불인정을 넘어 성별 임금 격차에 따른 경제적인 불평등을 맞닥뜨리기 쉽다.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공개할 수 없는 여성들은 성정체성을 폭로하는 아웃팅을 빌미 삼은 범죄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수적이다. 오로지 정계가 성소수자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고 난 뒤에야 이루어질 수 있는 해결책이다.
그 정권 속에 성소수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단언컨대 제도의 수립에는 당사자의 시선이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의 정체성을 가진 이들도 천차만별의 삶을 살아간다. 레즈비언이라는 명료해 보이는 집단 속에도 시스젠더와 트랜스젠더, 유성애자와 무성애자 등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각자의 차별과 혐오를 마주한 경험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할 여러 명의 레즈비언과 성소수자를 필요로 해야 한다. 다양성을 포용한 사회만이 올바르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다시, 우리가 레즈비언 대통령을, 국회의원을, 단체의 대표를 원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선출직에 여성과 성소수자의 존재가 당연하고, 시스젠더, 트랜스젠더, 유성애자와 무성애자인 레즈비언이 전부 특별한 자긍심을 갖추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일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는 레즈비언이 당연히 선출직을 맡고, 여성과 성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로 존엄한 세상을 바란다. 그리고 이를 위해 끝까지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25.04.26.
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